온종일 나 홀로 집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 요원해진 지 제법 긴 시간이 흘렀다. 휴일이 찾아와도 침대 위에 오도카니 앉아 다운받을 만한 영화를 찾았고, 봄날이 다가와도 집 안에 머물며 뒹구는 종이에 몇 송이 꽃을 그려 볼 뿐이었다. 이번 주 휴일도 어김없이 집이지만, 그간의 거리두기로 무료함을 메울 약간의 요령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나 홀로 집에서 사람도 만나고 전시도 감상해 보기로 한다. 양 손바닥 위에 책을 올리면 가능해지는 마법, 오늘의 길라잡이는 시인 ‘오은’이다.
MAGIC 1
사람들과 마주하는 아침
오은의 시집, 《나는 이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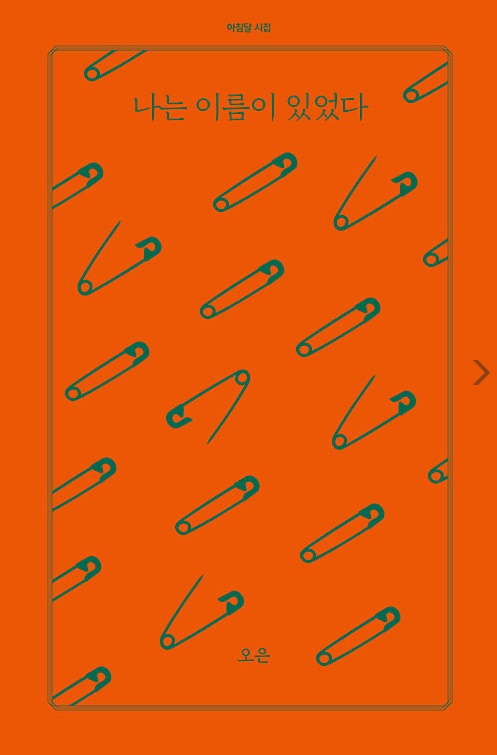
이번 달 생활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 경쟁자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어제의 영광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 내일의 행복을 처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기다림을 반복하는 사람과 기다림을 번복하는 사람이 있다.
–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바깥에서 맘 편히 사람을 만나지 않은(못한) 지 오래되었다. 한적한 곳에서 만나려고 해도 좀처럼 그런 공간을 알아내기 어렵고, 친구네 집에라도 가려 하면 이동하는 길목이 겁나고 무섭다.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 지 모를 여러 가지 위험이 어쩔 수 없이 집에만 머물게 하는데, 어지간한 집순이에게도 ‘사람이 고프다’는 게 무언지 알게 해주는 이상한 시절이다. 친구가 그리운 나날을 지나는 중에 문득 사람으로 가득한 시집 하나가 떠올랐다. 1쇄는 초록색 배경에 주황색 옷핀이 총총히 박힌 표지, 2쇄부터는 주황색 배경에 초록색 옷핀이 총총히 박힌 표지를 가진 《나는 이름이 있었다》가 그것이다.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로 시작하여 <사람>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시로 끝맺는 이 시집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있다. 궁리하는 사람, 바람직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읽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갔다 온 사람, 세 번 말하는 사람…. 시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한 행 한 행 읽어나가며 수많은 장면을 떠올린다. 나는 편편에서 만나는 화자들과 함께 ‘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응시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선을 긋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머릿속에 왔다 가는 사람들을 마주하며 마음으로 또박또박 인사를 건네는 휴일. “안녕하세요?” 종잇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여기저기 인사를 건네고 나니 마음에 자그마한 활기가 솟는다. 마지막 시편까지 읽고 책을 덮자 기분이 좀 이상하다. 이 수많은 사람이 전부 아는 사람들 같아서, 그 사이에 분명히 나도 있던 것 같아서.
MAGIC 1
그림을 읽는 한낮
오은의 색그림책, 《너랑 나랑 노랑》

이 책을 사실 때 주의할 점:
1. 물론 이 책은 색과 빛과 그림과 사랑에 대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2. 만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집어들었다면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왜냐구요?
3. 이 책에는 폭발물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4. 그 폭발물질이 당신의 감성과 아름다움과 사랑에 대한 열망과 결합할 때,
5. 그때 일어날 불꽃 축제에 관하여 이 책을 지은 오은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것들 앞에서 치열하게 웃고 울다가 드디어 쓸쓸해진 죄밖에는.
6. 당신에게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오래 이런 책을 보고 싶어한 당신의 기다림에 책임이 있다면 있을 뿐.
― 故 허수경 시인의 추천사
평소에는 전시를 보러 가야지 생각했다가도 막상 휴일이 오면 게으름을 부리다 나갈 시간을 놓치곤 했다. 부랴부랴 준비하고 나가봤자 게 눈 감추듯 후다닥 작품을 감상하고 돌아와야 할 것 같아 포기하기 일쑤. 어쩌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큰맘 먹고 나왔다가도 전시 요금이 생각보다 비싸서, 미술관까지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해서, 오늘은 미술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갖은 이유로 미술관 대신 다른 곳을 택하곤 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만 있는 시절이 닥쳐오니 왜 이리도 미술관에 가고 싶은지. 좋은 작품을 보지 못해서 이토록 무료한 건 아닌지 (비)합리적 의심마저 하게 된다.
시인 오은은 이런 나에게 작은 초대장을 건넨다. 《너랑 나랑 노랑》이라는 ‘색그림책’으로 놀러 오지 않겠느냐고. 색채라는 테마로 큐레이션도 깔끔하게 마친 이 미술 산문집은 집에서도 가뿐히 찾아갈 수 있는 한 권의 미술관이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가면 빨강, 파랑, 하양, 노랑, 초록, 검정이라는 색채를 메인으로 삼은 서른 점의 작품이 눈 앞에 펼쳐진다. 오은 미술관의 매력은 큐레이션 한 작품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저자는 큐레이터가 되어 《너랑 나랑 노랑》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직접 화가가 되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화가를 불러와 가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게다가 작품을 보고 느낀 바를 편지나 시로 만들어 읽어주기까지 하니 이 미술관에는 볼거리가 담뿍하다. 오은 시인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의 시그니처 컬러가 주황이란 사실을 알 테다(몰랐다면 지금부터 알아두는 것도 재밌을 것이다. 그의 시집 전부가 주황색 옷을 입었다는 귀여운 사실을 인지하게 될 테니!). REDBLUE-WHITE-YELLOW-GREEN-BLACK으로 이어지는 그의 큐레이션을 한 바퀴 돌고 나왔는데, 어쩐지 주황이 희미하게 비친 듯한 기분은 그 때문이었을까?
MAGIC 3
온기가 깃든 저녁
오은의 산문집, 《다독임》

다독다독은 의태어지만 다독이거나 다독임을 당할 때, 우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괜찮아, 괜찮아”라는 뭉근하고 다정한 위로가 들릴 때도 있고 “괜찮아? 괜찮은 거지?”라는 다급한 물음이 들릴 때도 있다. 어느 것이든 괜찮은 사람이 괜찮지 않은 존재에게 건네는 말이다. 하는 사람도, 그것을 듣는 존재도 그 순간만큼은 괜찮아지게 만드는 말이다. 마침내 나를 살게 만드는 다독임이다.
― 작가의 말 <다독이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돌아보는 일> 중에서
《나는 이름이 있었다》로 수많은 사람을 읽었고,《너랑 나랑 노랑》으로 갖은 작품을 감상했지만 책을 덮고 나면 이내 쓸쓸해진다. 책 속에 폭 빠져 있을 때 느낀 따듯함은 꿈이었던 것처럼, 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다시 집 안에 혼자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는 이상한 휴일. 오늘 같은 날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온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펼쳐 든 오늘의 마지막 책은 오은의 산문집 《다독임》이다. 이 책에는 아주 보통의 이야기가 틈틈이 새겨져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목욕탕에서 나눈 대화나 초등학생 두 명이 머리 맞대고 게임을 하며 나눈 이야기, 백지를 보며 했던 단상이나 국어사전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같은 것. 너무 사소해서 이토록 따듯하고, 지나치게 평범해서 이만큼 소중하다. 책장을 넘기는 내내 좋은 문장에 밑줄을 긋고 모서리를 세모나게 접었다. 다 읽고 보니 책이 울퉁불퉁, 한없이 못나 보인다. 접힌 쪽수만큼 공감으로 끄덕이고 다독이는 손길을 느꼈다고 생각하니 못생긴 책의 꼴이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세상엔 많은 시인이 있다. 가느다란 금테 안경에 가르마를 반듯하게 탄 시인,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머리는 늘 부스스한 시인,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품새가 근사한 시인, 작고 귀여운 타투를 몸 이곳저곳에 새긴 시인, 새파란 색으로 머리카락을 물들인 시인…. 수많은 시인 중 늘 입꼬리를 귀까지 걸고 무구한 웃음을 흘리는 시인이 있다.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순박하게 기록하는 시인, 천진한 오은 덕분에 온종일 집에서 보내야 했던 무료한 하루가 푸근하게 저물어간다. 오늘의 길라잡이에게 소소한 마음을 보내며 좋은 꿈을 꿔보기로 한다. 굿나잇!
글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