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예술 이론은 작품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지만,
가끔은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을 끄는 작품이 있다.
왜 그런지 모르면서도 한참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보는 것 너머의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글 문화진흥본부장 조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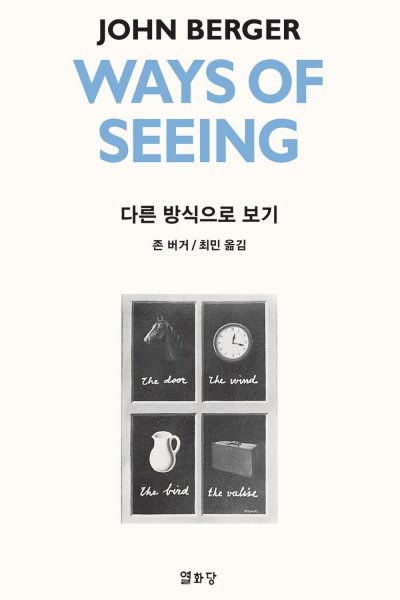
『다른 방식으로 보기(Ways of Seeing)』의 저자 존 버거(John Berger)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피사체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사이의 관계는 결코 확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지식 및 설명 등이 지금 내가 보는 것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는 이러한 현상을 회화 속에서의 언어와 시각 사이의 간극으로, “꿈의 열쇠(La clef des songes)”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즉 보는 것은 언어 이전에 오는 것이며 그 언어에 의해 완전히 묘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결코 물리적인 도달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글을 읽는 독자들은 모두 알 것이다. 많은 사람, 심지어는 평론가조차 현대미술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버거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예술 작품을 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
다. 작가(예술가) 혹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작품을 보는 방향과 대중(요즘 대중은 문화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의 관점에서 예술의 접근 방향에 대한 차이다. 즉, 마그리트가 말하는 꿈의 열쇠(핵심)는 아마도 작품 속에서 예술가(전문가)의 관점과 대중 관점의 간극이 되지 않을까 한다. ‘시각’은 예술가가 관객들에게 제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이미지이며, ‘언어’는 그 이미지를 접한 관객들의 생각이나 표현일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예술을 감상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일상적으로 말한다.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들으면서 대중이 이 작품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대중의 언어는 실질적으로 관객들이 보는 것이다. 그러면, 관객들이 작품을 온전히 즐기고 보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많아야 할까?
감상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고자 필자도 대학 때 미술사 공부를 했지만, 그것으로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과 필자의 언어 사이 간극을 줄이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나는 왜 큐레이터들이나 평론가들이 보는 내용을 보지 못했을까? 대학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종종 자책도 해본다. 아니면,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작품을 해체(deconstruction)할 능력이 없나? 그러면, 작품을 전문가처럼 분석할 수 있어야만 작품을 진정 즐길 수 있을까? 끊임없는 의문과 자괴감이 엄습한다.
작품을 아는 만큼 볼 수 있다고 하니 모든 지식을 총동원
해서 작품을 세세히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많은 평론가나 작가들은 작품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행간의 의미를 찾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면의 의미에 대해 고심하고, 작품을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문학 이론을 연구·적용 해왔다. 이러한 이론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에는 더욱 어렵지만, 그중에 많이 회자되는 ‘해체’를 활용하면 예술을 진정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해체를 간단히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사전적 정의의 해체는 다음과 같다. “문학이나 철학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이론으로, 한 문장이 한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웹스터 사전) 이러한 주장은 해체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해한 해체의 의미는 이렇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뇌는 그 단어의 반대 개념을 떠올려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많이 왜곡된다고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주장한다. 우리가 흰색에 대해 들으면 우리 뇌에서는 그 흰색의 반대되는 개념인 검은색을 떠올려서 흰색을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흰색은 ‘과장된 흰색’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사실일까?
앞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회화 속에서 언어와 시각 사이의 간극을 꿈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해체에서 주장하는 이분법(dichotomy)과 꿈의 간극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익히 시각적으로 경험한 흰색과 언어적으로 표현한 흰색 간에는 이분법적 간극인 꿈의 핵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관객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이러한 이론을 알지 못해서 혹은 흥미가 없어서 작품을 충분히 즐길 수 없는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학과 문화 이론을 공부한 필자도 작품을 처음 접할 때 해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이분법과 그 안에 내포된 언어의 계층적 체계(hierarchy)는 더욱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작품을 감상할 때 시각적 이미지가 전달하는 ‘특권(privileged)적 이미지’와 ‘낙인(stigmatized)된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고 작품을 감상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몇 년 전에 진행한 <게리 힐: 찰나의 흔적> 전시는 해체의 이론은 제한적이지만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자에게는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특권적 이미지인 작가(백인)가 낙인된 이미지인 노동자(히스패닉)를 보는 시각을 통해 미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갈등, 계급 및 삶의 애환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이러한 특권적 및 낙인된 이미지를 작품 제작 시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는 작품의 또 다른 내면을 보도록 필자를 강요했다.
비록 이러한 이론 없이도, 아니 이러한 이론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들은 작품을 자세히 보며 끊임없이 내용과 이야기를 찾고, 작품과 관객 사이의 관계를 유동적이지만 흥미롭게 할 수 있다. 해체 이론이 흥미롭고 행간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그래도 우리네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작품 감상법을 계속 추천하고 고집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읽고 보는 예술 작품은, 작품을 만들 당시의 다양한 배경과 역사를 포함한 밀접한 관계들을 이해하고 감상하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진다. 물론, 해체를 통해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으나,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작품 감상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는 전문가가 뭐라고 하든 오롯이 나만의 작품 감상법으로 작품을 즐길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워 전시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필자와 같이 용기를 내어 나만의 작품 감상법을 가지고 전시장에 와서 작품의 아우라를 즐기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장에 우선 와야 한다. 그리고, 나만의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내가 보는 전시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발견하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리고 그 흥미로움을 통해 나름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즐기도록 하자. 하지만 혹시 작품 감상에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면 도슨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시라. 작품에 대한 흥미와 풍미가 더욱 살아날 것이다.